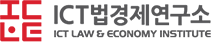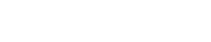Blog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최요섭] 디지털시장법의 최근 집행동향과 함의
디지털시장법의 최근 집행동향과 함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Ⅰ. 디지털 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한 정책 분야는 ‘디지털 규제’이다. 2015년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정한 이후, 많은 디지털 입법이 이루어졌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반법률(GDPR)」, 불법 콘텐츠를 규율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법(AIA)」은 많은 나라들이 참고하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이다. 그 중에서 디지털시장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가에서 디지털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참고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 실체 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기능조약(TFEU) 제102조의 내용과 중복된다. 따라서 디지털시장법 집행의 내용은 향후 유럽연합 경쟁법과 다른 나라 경쟁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Ⅱ.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 지정의 문제
1.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 지정의 내용 일반
디지털시장법 제1조는 디지털 분야에서 이용사업자(business user)와 최종이용자(end user)를 위한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보장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퍼’를 지정하고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디지털시장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게이트키퍼를 효과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은 관련시장 획정 없이 10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디지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①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②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에게 접근하는 데 중요한 ‘관문(gateway)’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③ ‘견고하고 지속적인(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시장법 제3조 제2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 기준을 설정한다. 다시 말해, ① 플랫폼 사업자가 추정 관련 연간 매출액이나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②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이용자 및 이용사업자의 수가 디지털시장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한다. 위의 조건 ②는 이용자의 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개정안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2. 게이트키퍼 지정 불복의 소: 바이트댄스 판결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6개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였다. 첫 번째 지정에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트키퍼에 포함되었다. 2024년 5월에는 부킹닷컴(Booking)이 추가로 게이트키퍼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후에 디지털시장법상 지정된 게이트키퍼는 모두 7개 플랫폼 사업자이다. 위의 지정은 행태주의적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플랫폼인 바이트댄스는 디지털시장법 제3조 제2항의 정량적 기준에 근거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이트댄스 판결은 디지털시장법의 첫 번째 사건이면서, 법원이 게이트키퍼 추정 조항을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유럽일반법원이 집행위원회의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을 인용하면서, 디지털시장법 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논의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Ⅲ. 디지털시장법의 집행 내용과 분석
1. 새로운 경쟁폐해이론에 근거한 실체 규정
유럽에서 주로 논의되는 디지털 ‘경쟁폐해이론’은 네 가지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능조약 제102조 사건은 ① 구글 쇼핑의 자사우대 ② 구글 안드로이드의 파편화 금지 ③ 메타의 데이터 결합행위 ④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 우회 제한(anti-steering) 등이 있다. 구글 쇼핑 상고심에서 ① 2024년 9월 유럽최고법원인 유럽법원(Court of Justice)은 구글의 자사우대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②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은 현재 유럽법원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하여 ③ 메타 사건에 대한 선결적 판결이 2023년 7월에 있었고 ④ 2024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우회제한행위를 경쟁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다.
2. 게이트키퍼의 실체 규정 위반에 대한 최근 조사
2024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상 실체 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알파벳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의 ‘다른 결제 방식 우회’와 구글 검색의 자사우대정책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파벳의 행위와 유사하게, 애플의 ‘앱스토어’의 다른 결제 방식 우회 및 사파리(Safari)의 선택 화면에 대한 제한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할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디지털시장법 실체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외에도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앱마켓)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구조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순위 관련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Ⅳ.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직된 디지털시장법의 접근 방법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디지털 법규범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추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범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정복멸 조항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장점유율에 따른 지배적 지위 추정이 SSNIP 테스트가 아닌 ‘6개 서비스 분야’ 기준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디지털시장법에서의 추정복멸 조항과 유사한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과 유사하게, 시장지배적 플랫폼 추정 조항도 정량적 기준과 더불어 정성적 기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